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당연히 교수로써 해야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ㅋㅋ 이게 교수마인드구나 ㅋㅋ
능력 안되면 그냥 좀 꺼지세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ist가 개꿀이긴함 애들 등록금 공짜야, 학부보단 대학원 위주야, 공간 널널해 지원금 널널해
그래서 ist에서 한 5~6년 달달하게 꿀빨다가 과제 여유좀 생기면 yk로 ㅌㅌ하는 교수만 5명넘게본듯 ㅋㅋ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ㅋㅋㅋ ist 교수라는데 능력이 안 되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삽시다..뭐만 하면 교수 까고 싶어서 안달난 학생들 많더라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전 ist 교수님들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서 식사하려면 차로 2-30분은 나가셔야하고, 서울에서 행사라도 열리면 KTX 수시로 타셔야 하죠.
이 뿐만 이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힘쓰시면 대부분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시더라구요. 어찌 매주 KTX를 타는 것이며 주말에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연구환경 좋은 만큼 실적 압박도 심한거 다 압니다. UNIST 같은 곳은 승진 실적 요구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환경만 보고 지방에 가셨던교수님들도 테뉴어 받기 전에 다들 도망가시잖아요. YK로도 많이들 가십니다 ㅎㅎㅎ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별한 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치열하게 연구하면 매일 10to10혹은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을 하거나, 장비를 집중적으로 돌리는 기간이 아니라면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미국의 대가랩들도 그렇게 안하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초과근무와 야근이 일상화된 이유는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외국과 달리 점심 시간이 길고, 그리고 솔직히 업무시간에 딴짓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6일/야근이 석사 과정에서 일반적인가요?
- 대학원생이 휴일 따위를 바라다니.
나는 주7일 매일 아침9시에서 새벽 1시 했소.
어리버리 석사 따는건 인생의 낭비죠.
그럴바엔 학부하고 취업하는게 나을거고, 어리버리 석사 기업에서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죽었다 복창하고 2년동안 자기 가치를 수직상승시키시길.
20대의 체력과 활력을 잘 활용하세요. 3040되면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요.
주6일/야근이 석사 과정에서 일반적인가요?
- 흠 저 수서근처사는데요...ㅋㅋ
그리고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조교수님중에 yk에서 K로 이적기회가있는데 안옮기실분 있을까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저만 실적 없어요"
이거 님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차별일 가능성 99% 라고 봅니다.
무슨 나는 부족해서 능력 없어요 이러면 이게 겸손이고 정답인 태도인거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차별이면 따져야됩니다.
그만두고싶어요(징징글)
- 의사 아닌듯?ㅋㅋ 의룡인에게 긁힌거보니...
근데 연구에 뜻이 있으면 의대 대학원 가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박사 전과(의대->생명공학) 결론은 다 됨.
- 컬럼비아일 것 같네요. 거기가 이상하게 한국인 많이 붙이고 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소위 탑4도 좋지만 탑20 들어갔다고 해서 네임밸류 떨어져서 잘 안풀릴 것 같대면 그만큼 추한게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탑스쿨 들어간대도 다른 “밑 레벨“ 연구자들을 얼마나 깔보게 될 지도 가늠이 안되네요.
자고로 연구하는 사람이면 세상이 다 틀려도 내가 진리를 보이겠다는 야심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학교 랭킹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요. 실제로 진짜 대가들은 자기가 몸담아왔던 학교를 빛나게했습니다. 저어기 구석에 박힌 주립대도 무시안당하는 이유를 자기 존재자체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애리조나 너무 우습게들 보시네. ㅋㅋㅋㅋ
눈이 전부 하버드에만 가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이 다 ㅈ으로 보이나봐요?
억셉해야 할까요?
- 누가 회복되었다고 하나요? 지금 교수님들 전부 다 펀딩 상황 안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뽑는 교수 수도 반이 줄었습니다. 물론 역량과 운이 따르고 네트워킹을 잘 한 분들은 미박을 가기도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박사진학관련하여 NTU오퍼 vs 미박도전 관련하여 선배 연구자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AI 쪽은 nus,ntu 가 서울대보다는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쎄구요, 미국 포함해서 국제적 평판도 높습니다 . 나오는 논문들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 교수들도 알아요. 아마 부정적인 윗댓들은 제가 모르는 다른 쪽 분야이신 듯. 카이스트는 AI 대학원에 워낙 튼튼한 교수풀이 있긴 하지만 잘하시는 교수님들 워낙 다들 창업에 힘쓰는 편이고... 스타 교수들은 싱가포르가 훨씬 급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카이 AI 탑랩 아니면 저는 싱가포르를 고려사항에 넣어도 좋다고 봐요. 해외 적응 리스크 관점에서도 싱가포르 정도면 아시아 문화지만 한국이랑 다르게 국제적 career, 인맥도 쌓을 수 있으니 균형있는 있는 선택일 듯요.
싱가폴 ai 대학원과 국내 대학원
박사 고년차 돼도 공부하러 읽는 논문 많이읽나여?
2021.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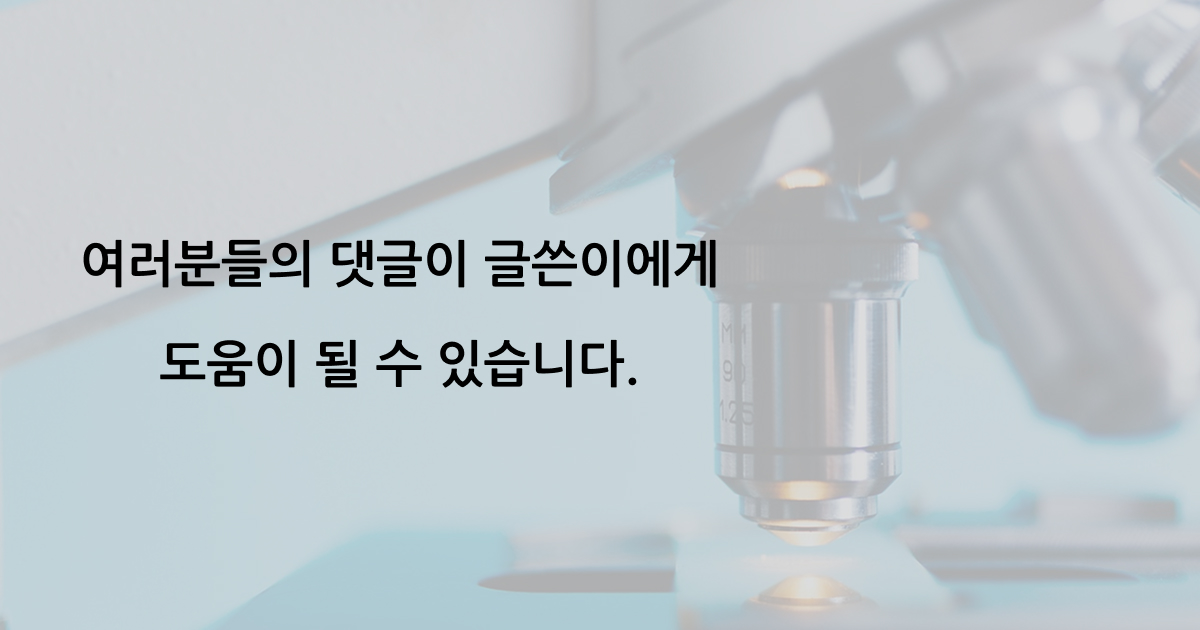
고년차때는 연구방법이나 아이디어 찾아보는거 외에 공부성 논문도 많이 읽나ㅏ야ㅕ?
센빠이들 어떤지 궁금합니다ㅎㅎ
대학원 옮기길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첫 citation 뽕맛이 엄청나네요...
나때문에 엄마가 포기한 것들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핫한 인기글은?
- 나의 선생님 (자랑 포함..)
- 지난 10년간 국제 심리학계를 뒤흔든 재현위기 (reproducibility crisis) 요약 (2편)
- 연구실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 내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역할
- 지능없고 바라는 것만 많은 학생새끼들 보아라
- 교수님들 학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 대략 보니까 워라밸 주제가 핫한데요. 교수입장에서 보면,
- 교수 육각형 부활안하나..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교수님의 사업제안 거절 이후 냉랭해진 관계
- 그만두고싶어요(징징글)
-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융합의학과 교수 김남국에 대한 고발
- 공대기준) 서울대 대학원이라도 서울대는 서울대인가요?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주6일/야근이 석사 과정에서 일반적인가요?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박사 전과(의대->생명공학) 결론은 다 됨.
- 안녕하세요. 메타인지가 부족한건지 아니면 꿈이 큰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일단 저는 대학원이랑 관련없는 일반인이긴 한데요
- 실험 실패와 의욕 저하
-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 서울 중위권 석사 후 설카포 석박통합
- IEEE ACCESS vs ACL, CVPR, EMNLP, ICML 등...
- 미래에 박사학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 대학원생 미박 지원 고민중입니다.
- 충북대 재학중) Ai 대학원 스펙 봐주실 수 있나요
- 이런 신생랩 가도 되나요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 올리젝 예상..
- [Direct Ph.D.] 논문 없이 풀펀딩 박사 합격 후기
- 나의 선생님 (자랑 포함..)
- 지난 10년간 국제 심리학계를 뒤흔든 재현위기 (reproducibility crisis) 요약 (2편)
- 연구실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 교수님들 학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 대략 보니까 워라밸 주제가 핫한데요. 교수입장에서 보면,
- 교수 육각형 부활안하나..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교수님의 사업제안 거절 이후 냉랭해진 관계
- 그만두고싶어요(징징글)
-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융합의학과 교수 김남국에 대한 고발
- 공대기준) 서울대 대학원이라도 서울대는 서울대인가요?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김박사넷 유학교육 2월 밋업 (2/21, 2/22)
- 미국 박사 대안으로 싱가폴
- 억셉해야 할까요?
- 어드미션 레터의 펀딩 관련 내용.. 뭐가 맞을까요
- 박사진학관련하여 NTU오퍼 vs 미박도전 관련하여 선배 연구자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주6일/야근이 석사 과정에서 일반적인가요?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안녕하세요. 메타인지가 부족한건지 아니면 꿈이 큰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실험 실패와 의욕 저하
- 서울 중위권 석사 후 설카포 석박통합
- 미래에 박사학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 충북대 재학중) Ai 대학원 스펙 봐주실 수 있나요
- 이런 신생랩 가도 되나요

2021.01.25
2021.01.25
2021.01.25